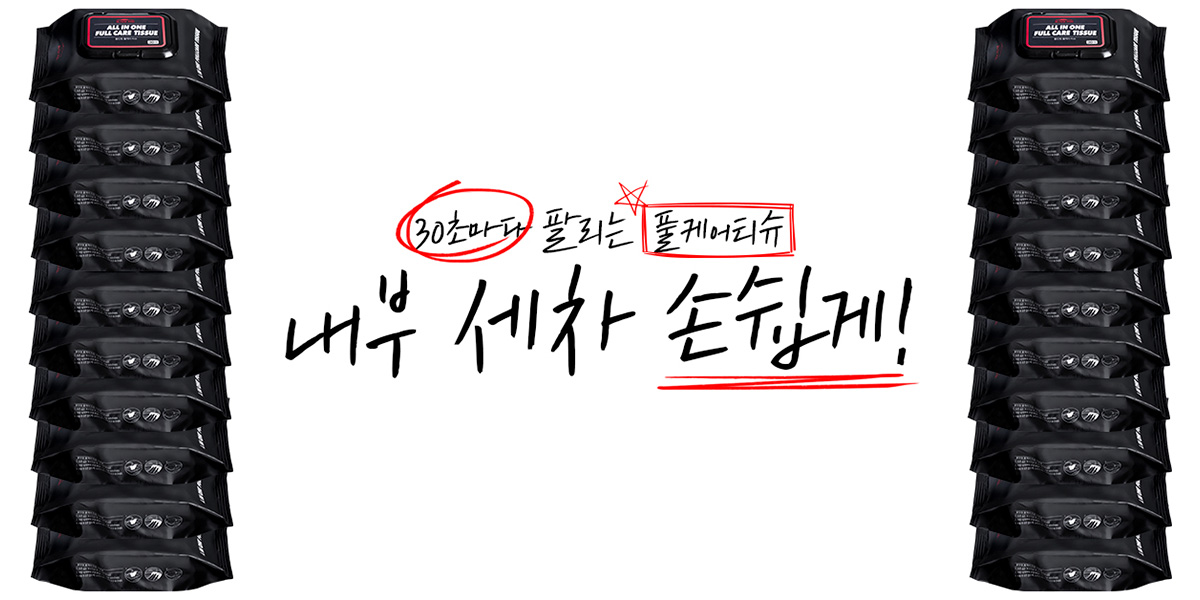운동해도 무용지물? 알츠하이머 부르는 뜻밖의 원인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오랜 시간 앉거나 누워있는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밴더빌트 대학 의료센터 연구진은 최근 좌식 생활과 알츠하이머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학술지 \*알츠하이머와 치매(Alzheimer’s & Dementia)\*에 게재했다. 해당 연구는 2024년 5월 13일 발표됐으며,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오랜 시간 앉거나 누워있는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밴더빌트 대학 의료센터 연구진은 최근 좌식 생활과 알츠하이머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학술지 \*알츠하이머와 치매(Alzheimer’s & Dementia)\*에 게재했다. 해당 연구는 2024년 5월 13일 발표됐으며,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뇌에 쌓이는 비정상 단백질(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에 의해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 인지 기능, 판단력 등에 영향을 준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알츠하이머에 대한 조기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남녀 404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1주일 동안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일상 속 신체 활동 수준을 객관적으로 수집했다. 이후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참가자의 평균 운동량을 분석하고, 약 7년이 지난 뒤 이들의 인지 능력 테스트와 뇌 MRI를 진행해 신경 퇴행성 변화 여부를 비교 관찰했다.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참가자의 약 90%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주 150분 이상 수준의 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경우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억과 학습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hippocampus)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다. 해마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뇌 영역으로, 이 부위의 위축은 치매 발병의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운동 여부와 무관하게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습관이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운동을 했는가'보다도 일상 속 활동성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했다. 특히,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에 취약한 유전자인 아포리포단백질 E(apolipoprotein E, APOE) 보유자에게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 유전자는 알츠하이머 고위험군을 분류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좌식 생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앤젤라 제퍼슨(Angela Jefferson) 박사는 “단순히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뇌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중간중간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짧게라도 자주 일어나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운동 중심 예방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좌식 생활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하루 30분의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는 일상 속 생활 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운동뿐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활동량을 높이는 생활 구조의 변화가 인지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예방 전략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